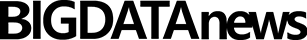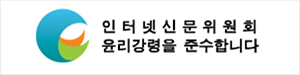![[ 사진 내용 :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 ]](https://cgeimage.commutil.kr/phpwas/restmb_allidxmake.php?pp=002&idx=3&simg=20250226105145090606cf2d78c68175193255143.jpg&nmt=23)
혼인 외 출생아는 2013년 9300명에서 2020년 6900명까지 줄었다가 2021년 7700명, 2022년 9800명, 2023년 1만900명으로 늘었다. 혼인 외 출생아 비율은 2013년 2.1%에서 2023년 4.7%로 10년만에 두배 넘게 증가했다.
인지란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하여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子)라고 인정함으로써 법률상의 친자관계(親子關係)를 발생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우선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남편의 친생자 추정과 관련해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면서(1항) △혼인이 성립한 날부터 200일 후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2항)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3항)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인지는 부(父)가 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자(母子) 관계가 분명하지 못한 기아(棄兒)와 같은 경우에는 모의 인지가 필요하게 된다. 임의인지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므로(859조 1항) 단독의 요식행위이다. 강제인지는 가정법원의 심판에 의한다(가사소송법 2조 1항 나류 9). 청구의 상대방은 부 또는 모이며, 부 또는 모가 사망한 때에는 그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이내에 검사를 상대로 하여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다.
임의인지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의무자는 없고 신고적격자만 있다. 즉, 부 또는 모가 신고적격자가 되며 대리인에 의한 신고는 할 수 없다. 신고의무자는 인지청구의 소를 제기한 자 또는 조정을 신청한 자이며, 그 상대방도 신고를 할 수는 있으나 의무는 아니다. 또한 인지된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출생신고의무자가 사산신고의무자에 해당한다.
특히 가사소송법은 강제인지에 관하여 조정전치주의(調停前置主義)를 채용하고 있으므로 인지심판청구 전에 먼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한다(50조). 조정에 의하여 당사자간에 인지의 합의가 성립되면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똑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이를 조정인지라 한다. 인지의 효력은 그 자의 출생시에 소급하지만, 제3자의 기득권을 해할 수는 없다.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재판상 인지란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말하며, 혼인 외의 출생자와 부 또는 모와의 사이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함을 목적으로 하는 인지청구소송의 판결을 통해 이루어진다. 인지청구 소송에선 통상 유전자(DNA) 검사로 친자관계를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인지청구의 소를 통해 친생자로 인정되면 그에 따라 친권, 양육, 부양, 상속, 유류분 등 다양한 법적 권리가 회복된다. 현행 민법상 혼외자가 법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인지’ 절차가 필수부가결한 요소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해 인지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면 가사 소송 변호사의 법률 조력으로 법적 지위를 회복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