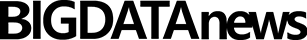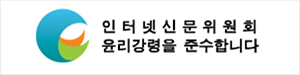사와다(澤田) 마이니치(每日)논설위원의 라는 책을 읽고

이어 사와다씨로부터 한국출판사를 통해 책을 보내니 읽어봐 달라며 카톡 안부를 전해왔다. 2번에 걸친 마이니치신문 서울특파원을 마치고 2015년 귀국하기 전 부부동반 식사를 한 게 마지막 만남이었다. 2번 서울특파원 중간에 주로 동경본사 외신부에서 있다가 스위스 취리히특파원으로 나갔다는 말을 들었다. 국제통에다 한반도문제 전문가다.
1999년부터 2004년 4년 반 한국의 제휴사인 조선일보사 사무실에서 한번, 프레스센터에서 두세 번 만났다. 돌아가서 2006년 '탈일(脫日)하는 한국'이라는 책을 일본어로 썼다는 소식을 들었다. 반일(反日), 극일(克日)이란 말은 많이 들었으나 ‘탈일’이란 단어는 많이 쓰지 않는 말이다. 우리는 굳이 쓰자면 ‘탈 일본’정도일까. ‘탈일’이라는 단어자체가 내게는 30대 신세대의 감각으로 보였다.
이번에 작자 소개를 보니 2011년부터 4년간 서울지사장을 한 뒤 동경에 돌아가 2015 '한국 반일(反日)의 진상'이란 책을 내 아시아태평양상을 수상했다. 2017년에는 '한국의 새 대통령 문재인은 어떤 사람인가'등 2권의 일본어책을 더 냈다. 이번이 4번째 책인데 처음으로 한국어로 번역된 터라 금방 읽었다.
좀 신선한 충격이었다. 1967년생이니 55년생인 나와는 양띠 ‘띠동갑’이다. 일본의 50대 중반 현역언론인인 그의 시각이 나보다 훨씬 ‘중립적’이었다. 나도 한국일보 국제부, 북한부등에서 기사를 쓸 때 자칭 ‘지일파’로 자부했지만 감각은 80-90년대에 머물러 있음을 일깨워 주었다. 그는 50대중반으로 유럽 취리히특파원까지 30여년의 언론사생활로 일본의 중견 언론인이 됐다.
진자 이유는 한국의 경제성장과 G10까지 국제적 위상이 올라가 간 때문으로 분석한다. 이제 한국인들은 1965년 한일협정이 불평등조약이라고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런 한국 내 분위기를 ‘강해진 한국이 내미는 도전장’이란 장에서 “한일의 국력이 마침내 대등해졌다”고 과감히 말한다.
또한 ‘한국이 좋다는 청년과 싫다는 중장년 남성’에서는 일본의 3차례 한류를 분석한다. 처음이 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중년아줌마들의 ‘겨울연가’의 배용준(욘사마)인기이고 두 번째가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서울과 도쿄를 오간 가수 보아, 탤런트 장근석에 대한 일본 젊은 층의 매료, 세 번째가 2016년부터 걸그룹을 거쳐 최근 ‘사랑의 불시착’등 넷플릭스를 통한 젊은 층의 한국드라마에 대한 인기를 들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 주류인 중장년층은 3차 한류도 느끼지 못한채 아직도 혐한서적을 읽고 헤이트스피치를 하며 한국을 ‘깔보고’ 있다고 말한다.
이런 변화를 못보고 작금의 한일관계를 ‘서로의 생각을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인’이라고 정리한다. 이 부분이 뜨끔했다. 나는 1988년4월부터 1년간 한국일보에서 동경의 게이오(慶應)대학 신문연구소에서 연수를 했다. 부인과 어린 두 딸과 함께 갔다. 동경의 남쪽종점인 게이오대학과 미타(三田)선 전철로 북쪽 종점인 다카시마다히라(高島平) 월세집에서 거의 매일 다녔다. 벌써 30년 전이다.
이후 4-5번 일본을 여행한 경험이 전부인 나는 그간 일본에 대한 공부도 잘 하지 않으면서 ‘일본통’으로 행세해왔다. 30여 년 간 한국일보 기자생활을 하면서 주로 외신, 국제부, 북한부에서 기사를 썼다. 사와다씨의 관심영역과 거의 겹치는 셈이다. 그러나 90년 이후 중국의 부상으로 일본보다는 중국 쪽에 더 관심이 쏠리기 시작했다. 북한의 핵개발이후에는 한반도 통일과 직접 관련된 중국과 미국의 양국관계가 중요했다.
사와다씨는 게이오시절 이토요이치(伊藤洋一)교수의 '국제커뮤니케이션'이라는 수업에서 만났다. 방문연구원이라 교수연구실을 제공받고 수업에 들어갈 의무는 없었다. 나는 일본말을 배우려고 용감하게 여러 학과학생들 30여명이 모인 ‘이또제미’(SEMINAR의 독일발음)에 들어갔다. 외국인으론 신화사통신 기자와 나 둘이었다. 일본학생과 중국인과 한국인이 모여 '독일기자가 본 일본인상'이란 책으로 토론을 하는 모양은 진짜 국제적 커뮤니케이션이었다.
사와다씨가 이 제미의 학생대표였다. 학생끼리 토론을 하고 교수가 커멘트하기 전에 나와 중국기자에게 한마디 거들도록 했다. 듣기도 힘든데 어눌한 일본어로 한 두 마디 했던 기억이 난다. 사와다씨는 이게 안쓰러웠는지 나에게 유난히 친절했다. 여름방학때 서울을 다녀왔다는 이야기도 들었다. 비교적 부유충인 게이오학생들은 미국, 유럽, 중국등에 관심이 많아 그는 한국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들과 대학 앞 나까도리(中道) 이자까야에서의 콘파(술자리), 이즈(伊豆)반도 게이오별장에서의 MT, 동경만에서의 보트놀이, 아쿠다가와(隅田川)에서 열린 우리 연고전같은 와세다대와의 경조전(慶早戰) 보트경기 응원 등 재밌는 추억들이 많다. 귀국하기 전 사와다가 한국에 유학하고 싶은데 보증인이 되어줄 수 있느냐고 조심스레 물었다. 젊은 ‘지한파’를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답십리 우리 아파트에서 같이 살았다.
모교인 고려대에 국제어학원이 생겨 3개월의 기초반을 다녔다. 어린 우리 두 딸이 예쁜 서울말을 가르쳐줬다. 3개월이 지나니 내가 일본에서 1년 일본말 공부한 것보다 한국말의 진도가 더 빨랐다. 고급반은 연세대로 옮겨 하숙을 했다. 또래의 하숙 친구들과의 교류때문인지 1년 뒤 일본으로 돌아갈 땐 한국어가 유창했다. 졸업 후 마이니치신문에 입사해 이 유창한 한국어가 두 번의 한국특파원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일본에서 진짜 ‘한국통’이 된 것이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