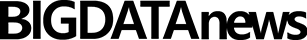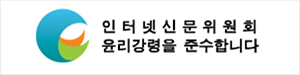지난 1월말 유럽연합(EU)의 의회가 영국의 탈퇴를 최종승인한 후 나온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즈지의 제목이다.
영국이 지난 1973년 유럽경제공동체(EEC)에 가입한지 47년만이며 2016년 6월 국민투표로 EU 탈퇴를 결정한지 3년 7개월만이다. 그것도 아무런 조건 없이 올해 말까지 떠나기로 한 ‘노딜 브랙시트(BREXIT)’다.
당시 언론에서는 영국과 EU간에 손익계산을 내놓았다. 우선 영국은 탈퇴의 명분인 유럽 외의 이민노동자들을 받지 않아도 된다. 유럽 국가들은 16세기부터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등 과거 식민지로부터 자원과 물자와 노동력을 착취한 원죄 때문에 이민 노동자들을 무조건 거부할 수가 없었다. 영국이 인도인인 마하트마 간디의 대학유학을 받아들이고 그룹 퀸의 리드 보컬인 프레디의 아버지를 파키스탄에서 받아들인 게 그 예다. 프랑스가 아프리카의 알제리를 병합한 후 프랑스인으로 인정한 것도 같다.
그러나 아프리카의 경제악화로 모로코, 튀니지, 알제리 등을 통해 지중해 해안에서 떠난 보트피플이 이탈리아와 스페인으로 몰려들어왔다. 또한 이라크 이란 시리아의 전쟁과 경제난으로 난민들이 터키와 그리스를 통해 발칸, 헝가리를 통해 독일 북구 등으로 밀려들자 유럽 국가들은 난민 배정에 골치를 앓았다. 이들 난민들은 구식민국인 프랑스 영국 네델란드 벨기에 독일 등에서 자리를 잡고 나아가 경제적으로 가장 안정된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등으로 가기를 원한다.
영국과의 개인적 인연이 생각난다. 1997년 한국기자협회장 때 주한영국대사관에서 초청을 받았다. 영국대사관 정무공사가 이임을 앞두고 한국기자협회 임원 3-4명을 초청해 저녁을 함께하자는 것이었다. 정무공사는 대외협력뿐 아니라 정보업무까지도 총괄하는 자리라 격의 없이 만났다. 기자협회 사무실이 프레스센터 13층에 있고 협회장 방은 덕수궁이 보이는 서쪽 끝이어서 조망이 좋은 덕수궁 옆의 성공회 성당과 영국대사관건물을 한번씩 내려다 보곤 했다.
이날 저녁은 대사관저가 아닌 양식당에서 만났다. 2-3시간 환담을 나누었다. 양식이라 술은 당연 스카치위스키인 조니워커였다. 그해 있을 한국대통령선거가 주 이슈였다. 식사 끝 커피타임 때 초청이유를 물었다. 공사는 웃으면서 ”잘사는 한국이 영국에 많은 투자를 해 달라“면서 또 우리가 마신 스카치위스키 수입관세를 좀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농담을 했다.
좀 놀랐다. 영국공사가 한국에 바라는 것이 이정도니 한국이 많이 크긴 컸구나 생각했다. 그때는 김영삼 정부 말 고도경제성장의 막바지라 한국 국민들의 콧대가 높았을 때였다. 그해 말 외환부족으로 갑자기 국제통화기금(IMF)관리를 받기 직전이었다. 미화 달러와의 환율이 600:1정도였으니 외국여행도 많이 하고 유럽 쪽에서도 명품가게의 큰 손님이었다. 1989년 처음 영국에 갔던 나까지도 영국은 물가만 비싸고 별로 살게 없어 ‘해가 지고 있는 나라’라는 느낌이었으니...
이번 브렉시트를 보면서 ‘대영제국’이라는 말이 생각났다. 이젠 자주 쓰지 않지만 아직도 ‘대영박물관’은 그대로 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영어이고 컴퓨터의 www.이후 더 많은 영어가 세계지배를 넓혀가고 있다.
영국의 유럽이탈은 이미 460여 년 전인 1534년 헨리8세의 로마가톨릭 탈퇴 후 수장령을 발표한 때부터다. 아들을 못 낳는다고 첫째 왕비인 캐서린과 이혼한 뒤 캐서린의 시녀인 앤 블린과의 재혼을 교황이 이를 인정하지 않자 ‘수장령’(首長令)을 선포하여 잉글랜드의 국왕이 잉글랜드의 교회의 유일한 우두머리라고 선언한다. 이것이 성공회다. 엄청난 역사적 사건이었다.
19세기 초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유럽대륙을 다 지배하고도 도버해협을 넘지 못해 벨기에의 워털루평원에서 결국 영국장군인 웰링턴에게 패해 물러났다. 제3제국의 히틀러도 2차대전때 무차별 런던공습을 감행하면서도 미, 영군의 노르만디 상륙작전을 막지 못해 실패했다. 런던중심의 자그만 잉글랜드가 같은 섬 내 웨일즈, 스코틀랜드지방을 병합해 그레이트 브리튼을 만들었다. 이어 바다건너 북아일랜드까지 합쳐 유나이티드 킹덤(UK)으로 2차대전후 국제연합에 가입했다.
UK는 아직도 전 세계 구식민지국가들과 만든 영연방(COMMONWEALTH)간에 럭비, 크리켓대회를 열고 화합을 다진다. 하지만 유럽의 ‘미운 오리’인 영국이 앞으로 전쟁을 치렀던 독일 프랑스 등 유럽대륙의 인근 국가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 궁금하다.<남영진 / 행정학박사·한국지역신문발전위원회 부위원장>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