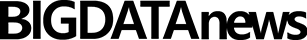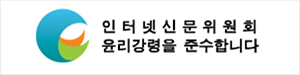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해 특허법원에 제소하는 비율도 특허심판원 출범 초기(’98.3 ~ ’02.12) 23.9%였던 것이, 최근 5년간(’18. 1 ~ ‘22. 12)에는 10.7%로 절반 이상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23,442건으로 제소율 평균은 16.1%를 기록하였고, 특허법원으로 제소된 23,442건 중 75.4%인 17,680건은 특허심판원이 내린 결론이 특허 법원에서도 유지된 것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 됐다.
이처럼 상표권 침해가 발생할 경우, 계약에 의한 상표권이 제한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브랜드 이미지가 실추하고 신용도가 떨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우선 상표법 제1조(목적)에 따르면 상표법은 이와 같은 상표를 권리로 보호함으로써 수요자에게 상품의 출처를 명확히 하여 상품 선택의 길잡이를 제공하고,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해서는 자신의 상표의 지속적인 사용으로 업무상 신용을 얻어 상품 및 상표의 재산적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상표권(商表權, trade mark rights)의 설정, 보호 및 규제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이때 상표권이 등록되면 상표권자만이 등록상표를 지정 상품에 관해 사용할 권리를 독점한다. 타인이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같거나 유사한 상품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나아가 상표법 제108조(침해로 보는 행위)에 따르면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타인의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행위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ㆍ판매ㆍ위조ㆍ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 또는 모조하거나 위조 또는 모조하게 할 목적으로 그 용구를 제작ㆍ교부ㆍ판매 또는 소지하는 행위 △ 타인의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가 표시된 지정 상품과 동일ㆍ유사한 상품을 양도 또는 인도하기 위하여 소지하는 행위 등에 대해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을 침해한 것으로 본다.
만약 상표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상황이라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처벌 받게 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상품 출처 혼동 행위 △영업주체 혼동 행위 △저명표지의 식별력·명성 손상 행위 △원산지 거짓표시 행위 △출처 오인 야기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상표권 침해행위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기도 한다. 특히 저작권법 위반의 경우와는 달리 상표권자와 조속히 합의에 이르더라도 양형 사유에 불과할 뿐, 이에 대한 형사적 처벌이 따르게 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상표권자 혹은 전용사용권자로서는 침해자가 상표권 침해행위로 인하여 얻은 수익에서 상표권 침해로 인하여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공제한 금액, 즉 침해자의 이익액을 손해액으로 삼아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혹은 상표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침해기간, 침해수량 등에 상응하는 상표의 사용을 허락하는 데 대한 통상적인 대가를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5다75002 판결 참조)
이에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김의택 대표변호사는 “상표권 침해가 발생한 경우 가능한 민사상 구제 수단은 침해금지청구와 손해배상청구 유형으로 나눠진다. 이때 상표권자는 자신의 권리를 침해한 자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상표권 침해는 기업의 존폐를 좌우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로,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세간은 상표권침해와 관련한 처벌 판결 여부에 집중하고 있지만, 기업이라면 추징금 액수의 산정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이다. 특히 과거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시기에 디자인 회사와 기업의 권리관계를 명확하게 명시하지 못했을 경우, 상표권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 계약기간이 만료됐거나 회사가 상장하여 산업재산권 분쟁에 직면했다면, 이에 대한 시의성 있는 대처가 관건이다.
만약 상표권 침해와 관련된 소송을 제기할 경우, 정보기술(IT)·지식재산(IP)·소프트웨어(SW) 기업의 리스크관리(RM) 및 경영전략에 대한 자문을 담당해 온 법무법인을 통해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