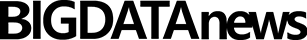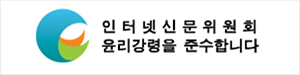최근 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인 파산 신청 건수는 총 1,940건으로, 전년도 1,657건보다 약 17% 증가했다. 이는 2014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자, 10년 전인 2013년(539건)과 비교했을 때 무려 3.6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법인파산 신청 건수 증가의 이면에는 경기침체에 따른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자금경색과 경영 위기가 자리하고 있다. 법원 통계에는 기업 규모가 명시되지 않지만, 실제 업계에서는 인건비·원자재비·금융 비용의 삼중고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더욱이 파산 신청 대비 법원이 실제로 인용한 비율은 10년 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이는 법적으로 파산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감 경기 악화로 사업 지속 의지를 잃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사업을 접는 경우가 많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경제적 어려움이 일시적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자금을 돌려막거나 사업을 무조건 축소하는 방식은 기업의 미래를 더욱 불투명하게 만든다. 또한, 경기침체 등을 원인으로 한 경영악화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 외부적 요인으로 인한 문제이기에 개별기업 스스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법인회생제도는 이처럼 자금 압박을 받는 기업에게 법원의 절차를 통해 채무 조정을 받고, 재정 구조를 개선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제도이다.
일정 요건을 갖춘 기업이라면 채권추심이 중단되고, 법원의 보호 아래 구조조정을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회생 시점을 놓치면, 법원이 회생 개시를 인가하지 않거나 회생 계획이 부결되어 파산절차로 전환되는 위험이 존재한다.
법률사무소 희승 전희정 대표변호사는 “기업 회생의 골든타임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특히 매출은 유지되나 부채 구조가 한계에 다다른 기업이라면, 회생과 파산 중 어느 쪽이 더 현명한 선택인지 전문가와 함께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라고 조언했다.
법인회생과 법인파산은 각각의 법적 요건과 효과가 뚜렷이 다르기 때문에, 기업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대전지방법원 파산관재인으로 활동 중인 전희정 대표변호사는 회생 및 파산 법률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다수의 기업 회생을 성공적으로 이끈 바 있다.
기업 경영의 위기는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위기를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하느냐”이다. 무리한 버티기보다는 지금,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법적 해법을 찾는 것이 회생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