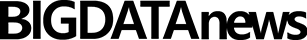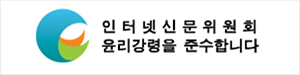하지만 여러 국적을 가진 상속 당사자가 있을 때는 상속재산의 소재지와 피상속인의 국적을 기준으로 법률관계를 판단해야 한다. 재산상속 시 내˙외국인을 구별하지 않는 것이다.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국제적 성질의 상속 분쟁이 한국과 관련이 있는 경우, 한국 법원은 국제 재판 관할권을 가진다”며 "자녀가 외국 시민권자라 할지라도 피상속인이 한국인이거나 상속재산이 국내에 있다면 국내 법원이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특히 상속분에 대한 권리가 침해되었다면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권리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 또는 3분의 1로 정해져 있으며, 배우자와 직계비속의 경우 절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경우 3분의 1이 보장된다. 국제 상속의 경우에도 유류분 권리가 보호되므로, 법적 검토와 증거 수집이 필요하다.
미국 시민권자 상속인은 유류분뿐 아니라 상속세 신고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해외 시민권자가 상속 재산을 받게 될 경우, 상속세 신고 문제가 발생한다. 피상속인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에 따라 상속세 납부 의무가 달라지며, 특히 상속재산이 10만 불을 초과할 경우 해외 송금 시 세무서 신고가 필수적이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국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재산을 증여할 경우에도 관련 세법을 정확히 검토해야 한다"며 "부동산 상속의 경우 해외 거주 상속인이라면 현지 공증과 서류 준비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기사에 도움을 준 김수환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상속전문변호사로, 상속, 유언, 상속재산분할, 상속세, 국제 상속 등 다양한 분야를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다. 법무법인 한중에서 상속전문클리닉을 운영하며 국제 상속 등 복잡한 상속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있다.
이병학 빅데이터뉴스 기자 lbh@thebigdata.co.kr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