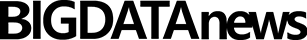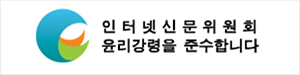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1호이기도 한 공수처는 1996년 시민단체 참여연대의 제안으로 시작해 국회의 부패방지법 발의 후 25년 만에 닻을 올렸다.
숱한 진통과 논란 속에 출범은 했지만 여전히 기대와 우려가 공존한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한 기대감과 '정권의 수호처'로 전락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시각이 그것이다. 이 때문에 막 출범한 공수처의 첫 번째 칼끝이 어디로 향할 것인지가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 되고 있다.
언론 보도 역시 지지하는 진영에 따라 각기 기대와 평가를 달리한다. 그만큼 공수처의 1호 사건 선정에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어떤 사건을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 공수처의 수사 방향을 가늠하게 해줄 것인지 갑론을박하며 정국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한마디로 공수처를 둘러싸고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공수처를 키워드로 빅데이터 분석과 그 함의를 살펴보는 것은 빅데이터 시대인 만큼 의미가 있어 보인다.
필자가 진행하는 국회방송 시사 프로그램의 빅데이터 코너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공수처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국민적 관심이란 단어가 결코 과장이 아님을 확인해 준다.
예를 들면 2019년 4월의 경우 8만 4천여 건을 기록,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추진 검찰 개혁 법안에 합의하고 사개특위에서 검찰 개벽 법안을 상정한 달로 정보량이 급증했다. 같은 해 10월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공수처 법률안 본회의를 12월에 부의하겠다고 밝힌 뒤, 12월 3일 실제로 본회의에서 자동 부의되어 정보량은 더 치솟았다.
11월에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공수처법 저지를 위한 단식에 돌입했고 12월에는 공수처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정보량은 17만을 기록했다. 이후 2020년 1월 14일 공수처법 법률안이 공포되면서 이후 정보량은 다시 급감해서 몇 달 동안 월 2만~3만대에 머물다가 같은 해 9월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야당 비토권 무력화'를 담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11월 공수처장 후보 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보량 그래프는 가파르게 상승했다.
대검찰청의 공개 반발 등도 있었지만 지난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0일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을 지명하면서 정보량은 조사 기간 2년 간 최대인 21만 건을 돌파했다. 12월 10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30일 문 대통령이 초대 공수처장에 김진욱을 지명하면서 정보량은 조사 기간인 2년간 최대인 21만 건으로 나타났다.
해가 바뀐 지난 1월 19일에 김진욱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21일에 초대 공수처장에 취임했다. 공수처가 공식으로 출범한 이후 어떤 연관어들이 급상승했는지 공수처가 출범한 21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공수처 관련 연관어를, 공수처 출범하기 전 3일 동안과 비교해서 관심어 1위에서 10위까지 살펴 본 결과, 특정 단어가 아주 높게 나타났다.
정부 과천청사에서 공수처장 취임식이 열렸기 때문에 먼저 정부와 과천청사 이 두 단어가 1위, 2위로 나타난 것은 크게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다. 따라서 3위로 나타난 '정치척 중립'이란 단어가 실제로는 1위에 해당하는데 이는 시사하는 바가 커 그 함의에 주목할만하다. 물론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 국민이 신뢰하는 공수처가 되겠다고 김진욱 공수처장이 취임사에 밝힌 만큼 관련 단어들이 많은 정보량을 차지했을 수 있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공수처가 국민의 신뢰를 얻어 도입 취지에 맞는 제도로 자리매김하기를 바라는 것에 더 큰 함의가 있을 것이다. 공수처는 빅데이터로 보여준 '정치적 중립'이라는 민심을 외면하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김다솜 / 글로벌빅데이터연구소 소장>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