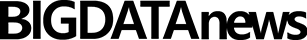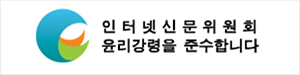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시간외 매매에서 실리콘투 주가는 종가보다 1.12% 오른 4만53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실리콘투의 시간외 거래량은 2만11주이다.
이는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금액이 48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류 덕에 K-뷰티 인기가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면서 최대 화장품 시장인 미국으로의 수출이 급증했다.
이는 기존 최대치인 2021년 상반기(46억3천만달러) 수치를 3년 만에 뛰어넘는 것이다.
상반기 화장품 수입액은 8억5천만달러(1조2천억원)로 무역수지는 39억7천만달러(5조5천억원) 흑자로 역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지난해의 경우 상반기보다 하반기 수출액이 더 컸던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올해 연간 수출액은 처음으로 100억달러를 넘어설 수도 있다. 기존 연간 최대치는 2021년의 92억2천만달러다.
또 화장품 회사들이 해외 공장에서 직접 제조해 판매하는 물량까지 고려하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한국 화장품 규모는 더 클 수밖에 없다.
아모레퍼시픽은 중국 상하이에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LG생활건강도 중국 베이징·광저우, 일본 사이타마 등에 화장품 공장을 두고 있다.
한국콜마는 미국 펜실베이니아와 캐나다, 중국에 공장을 두고 있으며 내년 초 펜실베이니아 제2공장을 완공할 계획이다.
코스맥스는 미국 뉴저지, 중국 상하이·광저우, 인도네시아, 태국 등에 공장이 있다.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은 10년 전인 2014년 상반기(7억9천만달러)와 비교해 6.1배에 이른다. 같은 기간 화장품 수입액은 7억4천만달러에서 8억5천만달러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처럼 한국 화장품 수출이 증가한 것은 전 세계로 퍼진 한류와 함께 K-뷰티에 대한 관심과 인기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한국 영화와 드라마,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스킨·로션 등 기초화장품과 립스틱·매니큐어 같은 색조화장품 등 한국의 우수 화장품이 전 세계에 소개되면서 수출로 이어졌다. 지난해 한국 화장품이 수출된 국가는 195개국에 달했다.
올해 상반기 화장품 수출액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이 12억1천만달러로 가장 많았고 미국 8억7천만달러, 일본 4억8천만달러 등이다.
한편 삼성증권은 실리콘투에 대해 개별 브랜드의 흥망성쇠와 관계없이 어떤 브랜드가 잘 나가든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췄다고 분석했다. 투자의견과 목표주가는 제시하지 않았다.
실리콘투는 국내 화장품 브랜드사들로부터 상품을 매입해 이를 해외 유통업체 및 최종 소비자에 판매하는 ‘중간 유통사’다. 매출의 대부분은 해외의 중소 유통업체로부터 발생한다.
한영수 삼성증권 연구원은 "국내 화장품을 판매하고 싶은 해외 유통사는 웹사이트에서 한 번에 여러 브랜드의 다양한 상품을 빠르고 편리하게 주문할 수 있고, 회사의 가격 협상력 우위도 누릴 수 있다"며 "회사가 주요 매출 지역에서 직접 지사 및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기에, 재고 수령 및 주문 대응도 신속하다"고 평가했다.
삼성증권은 실리콘투가 어떤 브랜드가 잘 나가든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회사의 모든 매출은 사전에 매입한 상품이 팔릴 때 발생하기에, 사업 구조상 늘 재고 부담을 지닌다"며 "실리콘투는 각 취급품목수(SKU)의 초도 매입량을 낮은 수준으로 설정하고, 판매·마케팅 실적이 좋은 경우에만 매입량을 점차 늘려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자체 개발한 ERP 시스템을 통해 유통 기한을 철저히 트래킹하고, 판매 추이가 저조하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판촉 행사로 재고를 해소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 덕에 회사는 브랜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면서도 과잉 재고 문제를 단 한 번도 겪은 적이 없고, 고속 성장하는 인디 브랜드를 여럿 발굴해냈다"며 "이 덕에 회사는 개별 브랜드의 흥망성쇠와 관계없이 어떤 브랜드가 잘 나가든 수혜를 볼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빅데이터뉴스 기자 kjh@thebigdata.co.kr
[알림] 본 기사는 투자판단의 참고용이며, 제공된 정보에 의한 투자결과에 대한 법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저작권자 © 빅데이터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